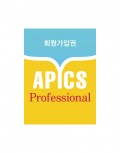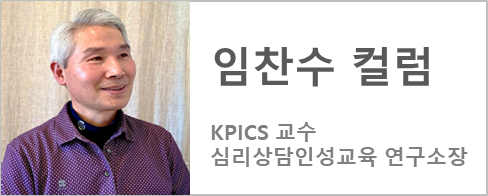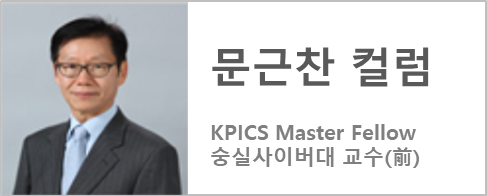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본 한국 언론의 문제점 |
|---|
|
Date : 2016-08-22
Name : 문근찬
Hits : 2850
|
|
구글이 투자한 영국의 벤처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의 대결은 세간의 큰 관심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내리 세 판을 진 이세돌이 묘수 한 방으로 알파고에 한 판을 이겨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학생 때 바둑도 좋아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한 때 컴퓨터에 의한 회사 업무의 전산화에도 종사한 적이 있어서 이번 대결의 관객 중 가장 관심 있는 사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주말 토, 일요일 오후 시간을 꼬박 이 바둑 대결을 보는 데 소비한 정도였으니 관심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알파고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대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개 이런 것이다. 우선 수천 가지 기보 정보를 바탕으로 알파고는 인간 고수들의 착점 패턴을 흉내 낼 수 있다. 그리고 알파고는 실전에서의 다음 착점에 대한 여러 후보에 대한 승률 점수를 분산처리하여 그 중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낸다. 여기서 승률 계산이란 단지 다음 수만이 아니라 한 곳에 돌을 놓았을 때 이어지는 상대방의 대응을 포함하여 전개되는 전체 모양의 승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계산의 규모는 실로 방대한 것이다. 또한 알파고는 개발된 두 버전의 시스템으로 바둑 대결을 시켜 스스로 더 나은 착점을 할 수 있도록 강화 학습하는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둑 수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점차 강해지고 있는 알파고의 현재 실력 수준을 볼 때, 알파고와 대결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의 대국에서 나오는 ‘흔들기’나 ‘기세’ 같은 인간의 감정 요소를 게임에 적용한다면 거의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대국의 결과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싶다.
이세돌이 위대한 점은 세 판의 경험을 통해서 알파고의 작동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간파를 해 낸 것이다. 이세돌은 중반까지 참고 참는 바둑으로 확정가를 챙기는 작전을 써서 알파고에 큰 세력을 내 주다 보니 4째 판도 사실은 대세에서 진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회심의 일격으로 알파고의 세력권 내에 흩어져 있던 죽은 돌들을 구출해 내오는 묘수를 놓음으로써 일거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4국 후에 기자회견에는 1승을 챙긴 이세돌을 칭찬하는 분위기 속에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알파고의 개발팀에서는 이세돌이 알파고를 중앙에서 극한으로 몰아붙여 허점을 발견하고 이겨 준 것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었다.
K기자는 “오늘 사용한 알파고 버전이 혹시 다른 것 아니었나?”, “알파고가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인지?”, “약점으로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의 속 뜻은 구글 측이 이세돌을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다른 의도로 알파고의 낮은 버전으로 4째 판을 두게 한 것은 아닌가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음모론적 발상이다.
S기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알파고는 이세돌의 기보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세돌은 알파고의 작동원리 등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바둑 게임에 적용될 때 알고리즘이 대개 어떤 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질문이다.
H기자는 “3대 0일 때 심리적인 쇼크가 크므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말을 꺼냈다.
원래 예상대로 이세돌이 이기면 괜찮지만 3:0으로 지는 국면에서는 계약을 파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몰상식한 질문이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계약의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생각 없는 질문이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기자는 이렇게 예의를 모르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NHK 기자는 인공지능을 의료보건에 접목할 때 알파고의 ‘묘수’가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의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묘수가 나왔을 때 의사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질문이다. 알파고에 쓰인 인공지능이 단지 바둑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중국기자는 “78째 수가 구리 선수의 의하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는 말을 했다. 이세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구리 선수도 칭찬하는 외교적인 발언이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음모론 정도의 저질 질문은 아니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우선 한국 기자들이 인공지능이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IT 분야 전공은 아니라 해도 좀 심하게 무식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성향이 평소 세상 문제를 너무 쉽게 음모론 쪽으로 몰아가는 못된 습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식이라면 국민소득을 포함하여 서구의 나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어렵겠다는 안타까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알파고와의 대결을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등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할 기술 영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입방아에 기자들이 가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알파고 이벤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대범하게 다루지 못하고 마치 동네 소문을 퍼 나르는 식으로 고십(gossip) 제조기의 노릇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천의 하나는 바로 언론계의 후진성이다. |
Content |
Name |
Date |
Hits |
|---|---|---|---|
|
문근찬
|
2016-08-22 |
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