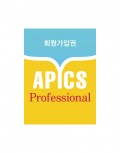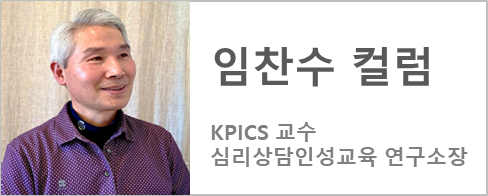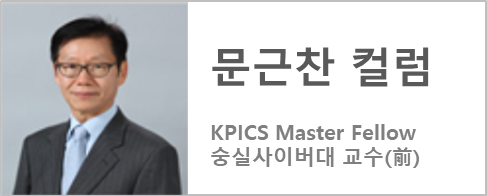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
|---|
|
Date : 2023-01-30
Name : 임찬수
Hits : 344
|
|
임찬수 칼럼(두 번째)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엾다, 측은하다.”고만 여기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잠시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에는 꽃과 나무와 새, 동물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 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만 ‘지식’과 ‘지혜’를 증득할 수 있을까. ‘지식’과 ‘지혜’는 별개로서 ‘지식’은 단순히 사물의 아름알이를 말하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통해 증득되며 상호 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지혜’가 바로 증득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성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올바른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지성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세상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신 패러다임 복지정책’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복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대부분은 복지사업을 봉사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양로원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복지 시설에 가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거나 양식과 연탄 등을 나누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감하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고서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 이 나라에 복지수급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나중에는 자신이 복지수급자가 된다. 그럼 봉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일까? 정답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 속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가는 것이다. 부자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한갓 적선에 불과하다. 이것은 가진 자의 오만이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도 어렵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그 속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처럼 노후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보살처럼 착한 일만 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없다면 봉사할 필요가 없다.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로만 끝내지 말고 무엇이든 그 속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매스미디어와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접한다. 그중에는 병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노숙자의 이야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을 측은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런 뉴스를 들을 가치조차 없다. 그들의 어려운 삶이 내 귀에 들린다면 지금 내 삶도 어느 정도 힘들다는 말이다. 어쩌면 나 또한 30% 곤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세상은 3대 7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부유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자연의 3대 7의 법칙을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는다든지, 복지시설에 갈 일이 생긴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는 돕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도 그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30%의 관심만 보이지만, 옆 사람에게서 직접 듣게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이 70%가 되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 결국 자신도 성공하거나 실패할 활률이 100%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을 깨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 복지수급자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깨닫고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봉사를 갔다 오면 자신의 에너지가 좋아져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엾다, 측은하다.”고만 여기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기운도 좋아져서 이 다음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진정한 ‘신 패러다임의 복지 사업’이다. 말하자면 복지수급자가 된 사람에게 그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찬수 칼럼, 20230201-두 번째】 세 번째, 희망을 잃은 청년에게. |
Content |
Name |
Date |
Hits |
|---|---|---|---|
|
임찬수
|
2023-01-30 |
344 |